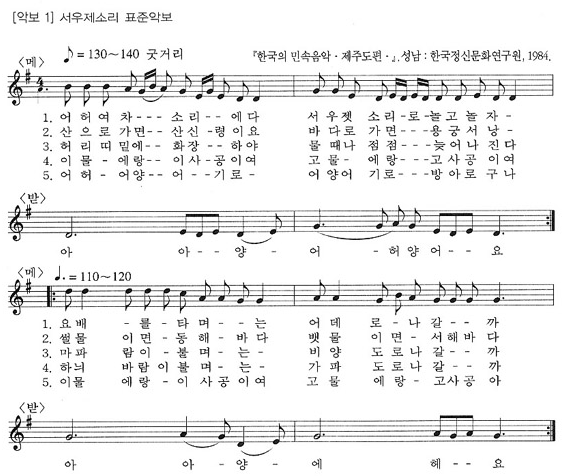26. 서우제소리

<서우제소리>는 제주도에서 영등굿 등의 굿을 할 때 석살림이나 영감놀이 등의 제차에서 부르던 무속음악으로 영감신이 한라산에 와서 영감놀이를 하는 과정까지를 풀이하는 과정과 제주도의 여러 가지 정황, 역사·지리적 환경, 생활환경 등을 소상하게 풀이한다.
영감놀이란 연희적 의례를 수반하는 가면극 형식의 굿놀이로써 영감신이 씌어서 병이 생겼거나 배의 신인 신왕을 모시려고 할 때 연희된다. ‘영감’은 ‘참봉’ ‘야채’로도 불리는 일곱형제의 도깨비신으로, 서울 먹자고을의 허정승(또는 유정승)의 아들들이다. 이 아들들은 전국의 산을 하나씩 차지하고 있는데, 첫째는 서울의 삼각산, 둘째는 백두산, 셋째는 금강산, 넷째는 계룡산, 다섯째는 태백산, 여섯째는 지리산, 일곱째 막내는 한라산을 차지하고 있다. 이 영감신은 대접을 게을리하면 심술을 부려 집 네귀퉁이에 불을 붙이는 등의 해꼬지를 하기도 하고, 해녀나 과부 미인등을 좋아해서 그들에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고 밤에 규방을 드나들어 괴롭히기도 한다.
<서우제소리>는 가락이나 사설엮음이 비교적 고정적이어서 구성지고 유창한 맛을 준다. 지역에 따라서 이 노래를 터부시하여 부르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간에 전이되어 유흥적인 場에서도 가창되어 통속민요로도 불리고, 김매기소리로도 불린다.
<서우제소리>의 가사는 주로 영등굿 등에서 바다 노동과 관련하여 가창되던 사설의 영향을 받아 주로 바다노동과 관련된 사설이 사용되고 있고, 후렴구는 ‘아하 아아 어양 어요’ ‘어양 어여 어양 어양 어양 어라’ ‘어양 어허기 어허양 어요’ ‘어야뒤야 서낭이로구나’등이 사용된다.
가창방식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선소리를 하고 여러 사람이 후렴을 받는 형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민요의 가락과 사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선소리를 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 사설엮음이 뛰어나고 목청이 좋은 사람들이 담당한다.
<서우제소리>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불려 약 여덟 종류가 있지만, 표준악보는 <서우제소리>를 간략하게 하여 부르기 쉽게 만들어 놓았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표준화한 악보[악보1]도 참고로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