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발음법(發音法)
단소의 장점은 불기 쉽고 휴대하기 간편하며 음색이 맑고 아름다운 점이라고들 흔히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리 내기가 그리 쉽지 않다. “단소는 소리만 나면 반은 됐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단소에 있어 소리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고 소리내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발음법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을 때 단소의 일반화는 물론 국악교육도 성공을 거둘 것으로 생각된다.
1) 취구에 입술대기
취구에 입술을 갖다 댈 때 입술의 모양은 어떠해야 하며 취구의 어느 정도 위치에 놓아야 하는가의 두가지 문제로 요약된다.
입술의 모양 : 휘파람 불 때와는 정반대로 양 입술을 좌우로 팽팽히 당겨 二자 모양을 한다. 이때 입술이 너무 느슨하지 않고 약간 긴장되도록 한다. 그런 다음 입술의 가운데를 조금 열어 김이 나오도록 한다.
입술대는 위치 : 단소는 다른 취악기와는 달리 취구가 작은 까닭에 어느정도 위치에다 입술을 갖다 놓아야 소리가 나는지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 입술 놓는 위치는 취구를 대략 6등분하여 5/6정도 위치에 아래 입술을 밀착시켜 좌우 밑으로 소리가 새지 않도록 갖다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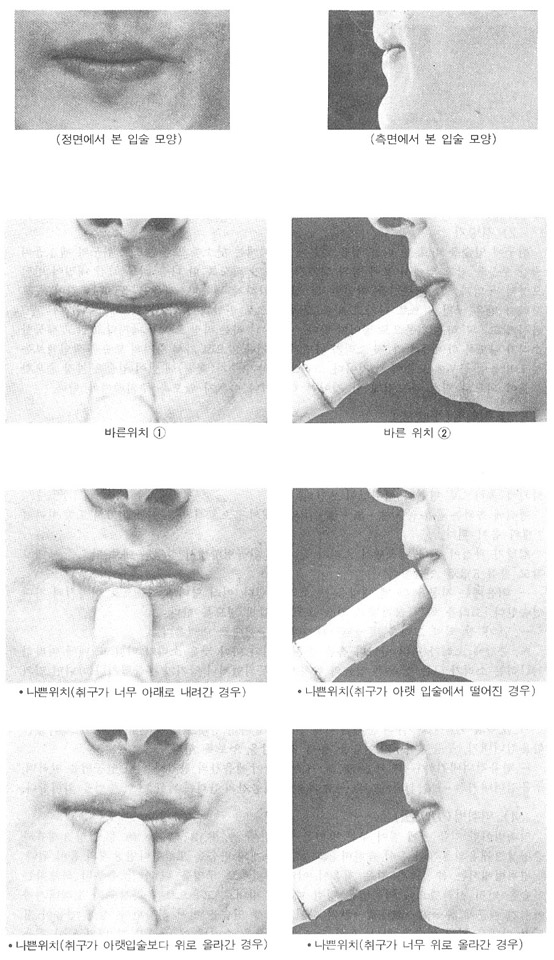
2) 김넣기
취구에 입술을 바로 댄 다음 김을 넣는데 이 때에는 단소를 오른손으로 취구와 제 1공의 중간 부분을 잡고 옆에서 보아 몸과 악기가 45도가 되도록 한 다음 혀를 약간 내밀어 반달모양의 구멍과 일치되는가를 확인한 뒤 김을 약하게 넣는다. 김을 넣을 때는 김이 둘로 갈라져 반은 구멍 밖으로 나가고 반은 구멍 안으로 반반씩 들어가도록 하며 ‘후’나 ‘투’하지 말고 ‘휘’하는 기분으로 넣어야 한다. ‘시-ㄱ’하는 바람소리가 나지않고 맑고 깨끗한 소리가 나도록 하여야 한다. 첫 소리가 나면 즉시 거울 앞으로 가서 자기의 모습을 확인해 보는것도 발음법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취악기 주자(奏者)에 있어 입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므로 항상 부드럽게 할 것이며 터지거나 마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평취법(平吹法)
대금, 중금, 당적, 단소 등의 관악기는 저취(低吹), 평취(平吹), 역취(力吹)라는 특수한 연주법이 있는데 저취란 김을 약하게 불어 넣는 것이고, 평취는 보통 김으로 부는 것이며, 역취는 김을 세게 넣어 부는 방법을 말한다. 단소는 다른 죽부악기보다 음고(pitch)가 높은 악기에 속하므로 평취와 역취만이 쓰인다.
평취에 속하는 음은 仲 · 林 · 無 · 潢 · 汰의 5개 음으로서 반음 來과 南까지 포함한다면 7개의 음이 된다.
김넣기 과정이 끝나 계속해서 소리가 잘 나면 안공법항에서 설명한 대로 단소를 제대로 잡고 평취 5음을 연습한다.
-. 처음에는 지공을 다 뗀 개방음 汰소리를 낸다. 여러 형태의 리듬으로 변화시켜 가며 연습한다. 소리를 똑똑 끊지말고 김을 고르고 길게 넣도록 한다.
-. 汰가 잘 되면 그다음 潢→無→林→仲의 순서대로 내려온다.
-. 중간에 소리가 나다 안나다 혹은 높은 소리가 나다 낮은 소리가 나다 또 때에 따라선 ‘삑’하는 소리가 나는 것 등은 입술의 위치가 잘못되었거나 악기가 흔들렸거나 아니면 김의 강도 내지는 세기의 조절이 잘못되었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침착하게 인내를 가지고 차근차근 연습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 汰→潢→無→林→仲의 순차적 하행 연습이 끝나면 반대로 상행 연습을 하고, 그 다음은 한음 건너내기, 두음 건너내기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얻도록 한다.
-. 한음 건너내기 仲↔無, 林↔潢, 無↔汰과 같이 세음간의 간격에 의한 안공법을 말하며, 두음 건너내기 仲↔潢, 林↔汰, 無↔![]() 과 같은 네음간의 간격에 의한 단소 주법을 의미한다.
과 같은 네음간의 간격에 의한 단소 주법을 의미한다.
4) 역취법(力吹法)
역취법이란 김을 세게 넣어 부는 방법을 말하는데 ![]() , 淋,
, 淋, ![]() ,
, ![]() ,
, ![]() ,
, ![]() 등 청성 3개음과 중청성 3개음의 6개의 음이 속하며 淶과 湳의 두 개의 반음을 포함한다면 8개의 음이 된다.
등 청성 3개음과 중청성 3개음의 6개의 음이 속하며 淶과 湳의 두 개의 반음을 포함한다면 8개의 음이 된다.
평취법에서는 仲 · 林과 같은 저음이 어려운 관계로 구멍을 다 연 汰음부터 하행하는 연습을 먼저 시작했으나 역취법은 평취 때와는 반대로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소리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 →淋→
→淋→![]() →
→![]() →
→![]() 의 순서로 상행 연습을 먼저 시작한다. 상행 연습이 잘되면 반대로 하행 연습을 한다 흔히 고음
의 순서로 상행 연습을 먼저 시작한다. 상행 연습이 잘되면 반대로 하행 연습을 한다 흔히 고음 ![]() 와
와
![]() 을 소리낼 때 소리가 잘 나지 않아 침을 뱉듯이 ‘튀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소리도 아름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침이 밖으로 튀어나와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고음을 낼 때에는 입술을 평취때보다 약간
더 오무려 가늘고 강하게 넣으면 된다. 또한 악기를 약간 세워서 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상행·하행 연습이 잘 되면 평취때와 마찬가지로 한음 건너내기, 두음 건너내기 등의 연습을 실시하며 마직막으로 평취와 역취를 연결하여 연습한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손가락도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김의 강도 조절에 대한 능력도 생겨 악곡을 연주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을 소리낼 때 소리가 잘 나지 않아 침을 뱉듯이 ‘튀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소리도 아름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침이 밖으로 튀어나와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고음을 낼 때에는 입술을 평취때보다 약간
더 오무려 가늘고 강하게 넣으면 된다. 또한 악기를 약간 세워서 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상행·하행 연습이 잘 되면 평취때와 마찬가지로 한음 건너내기, 두음 건너내기 등의 연습을 실시하며 마직막으로 평취와 역취를 연결하여 연습한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손가락도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김의 강도 조절에 대한 능력도 생겨 악곡을 연주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5) 옥타브 소리내기
仲↔![]() , 林↔淋, 無↔
, 林↔淋, 無↔![]() , 潢↔
, 潢↔![]() , 汰↔
, 汰↔![]() ,
, ![]() ↔
↔![]() 은 모두 한 옥타브 관계에 있는 음들을 나열한 것인데 두 개씩의 음들은 汰↔
은 모두 한 옥타브 관계에 있는 음들을 나열한 것인데 두 개씩의 음들은 汰↔![]() ,
, ![]() ↔
↔![]() 을 제외하고 운지법은 서로 같고 단지 김의 세기에 따라 음의 높이가 변할 뿐이다. 이러한 옥타브 소리내기는 앞의 평취법과 역취법 연습만 잘 이루어진다면 쉽게 습득될 수 있을 것이다. 저음→고음, 고음→저음으로 계속 바꿔가며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익히자.
을 제외하고 운지법은 서로 같고 단지 김의 세기에 따라 음의 높이가 변할 뿐이다. 이러한 옥타브 소리내기는 앞의 평취법과 역취법 연습만 잘 이루어진다면 쉽게 습득될 수 있을 것이다. 저음→고음, 고음→저음으로 계속 바꿔가며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익히자.
6) 동일음 중복시 주법
같은 음이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될 때는 한음 아래 음공을 가볍게 때려 주거나 혀 끝으로 입술을 툭 쳐서 내는 두 가지 주법이 있다. 仲(![]() ), 林(淋), 無(
), 林(淋), 無(![]() ), 潢(
), 潢(![]() ), 汰(
), 汰(![]() ),
), ![]() 등 각 음에 있어 어느 주법을 쓸 것인가는 연주자 자신에 달려 있으나 仲만은 혀 끝으로 입술을 툭 쳐서 내는 한가지 주법만이 사용된다. 때려줄 한음 아래의 음공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汰는 첫 번째 주법을 사용할시 제1공을 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왼손 모지로 제1공을 위에서 밑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며
등 각 음에 있어 어느 주법을 쓸 것인가는 연주자 자신에 달려 있으나 仲만은 혀 끝으로 입술을 툭 쳐서 내는 한가지 주법만이 사용된다. 때려줄 한음 아래의 음공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汰는 첫 번째 주법을 사용할시 제1공을 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왼손 모지로 제1공을 위에서 밑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며 ![]() 는 제4공을 때려주며
는 제4공을 때려주며 ![]() 은 제3공을 때려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은 제3공을 때려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7) 굴리기 주법
굴리기 주법은 단소 연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법이며, 단소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소리이기도 하다. 장식법의 일종으로 본음, 상일음, 본음의 3개음을 마치 구슬이 구르듯이 빠르게 내는 것이다. 악보에는  이나
이나  등의 부호로 표시된다. 이외 장식법에 관해서는 뒤의 기보법 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등의 부호로 표시된다. 이외 장식법에 관해서는 뒤의 기보법 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8) 농현법(弄絃法)
농현법은 국악의 멋을 내는 장식법의 일종으로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농현법을 통해 어떤 종류의 음악인지를 구별하고 중심음과 선법을 결정짓기도 하기 때문이다.
농현법에는 요성법(搖聲法)과 퇴성법(退聲法)이 있는데 요성법이란 서양 음악의 vibrato같이 소리를 흔들거나 떠는 방법을 말하고 퇴성법이란 소리를 흘러 내리거나 꺾는 방법을 의미한다.
요성법이나 퇴성법은 음악의 종류에 따라서 또는 선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한 이론적 바탕위에 적절히 사용하여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잘못된 농현법은 안하느니만 못하기 때문이다.
단소에서 흔드는 소리는 모든 관악기가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악기를 흔든다거나 입술을 떤다거나 고개를 흔들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나오는 숨을 강하게 또는 약하게 반복해서 규칙적으로 불어 넣음으로써 되는 것이며, 흘러 내릴 때에는 숨을 점점 약하게 넣으면서 고개를 약간 숙이거나 악기와 몸과의 각도를 45도에서 좀 더 넓혀주면 된다. 앞의 굴리기 주법과 함께 이러한 농현법과 같은 연주법은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일단 정규 학습에서 시도해 보아 잘 되지 않는다면 너무 무리하게 지도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레코드나 비디오 또는 교사의 범주(範奏)를 통해 단소의 특징이 이러한 특수 주법에 의해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려 줌으로써 단소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단계에서 끝내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러나 특별 활동을 통해서는 농현법의 단계까지 지도가 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