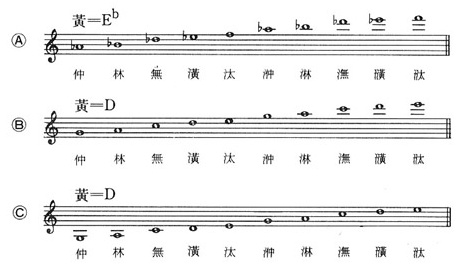5. 기보법(記譜法)
악보란 일정한 원칙과 약속에 따라 갖가지 표와 글로써 음악을 가시적(可視的)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는데 기보법이란 그 표시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8가지의 기보법이 있어 왔다. 율자보(律字譜), 공척보(工尺譜), 약자보(略字譜), 육보(肉譜), 합자보(合字譜), 정간보(井間譜), 오음약보(五音略譜), 연음표(連音標)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많은 기보법들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실용 가능한 것만이 남게되어 오늘날은 율자보, 육보, 정간보 3가지만이 쓰이며, 이중에서도 정간보가 가장 대표적인 기보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1) 정간 기보법
정간보는 15세기에 세종대왕이 직접 창안한 유량악보(有量樂譜)로서 우물정(井)자 모양의 네모 칸으로 되어 있다. 한 줄을 1각(刻) 또는 1행(行)이라고 하며 한 장단이라고도 한다. 세종 당시에는 32정간을 썼고, 세조 때는 16정간으로 개량되었는데 현재는 6정간, 12정간, 16정간, 20정간 등 여러 가지로 편리하도록 변형해 쓰고 있다. 1각은 몇 개의 강(綱)으로 나뉘어지며 각과 각 사이의 빈 공간에는 부호 및 노래 가사 등을 적어 넣는다.
네모 칸 한 칸은 1박으로 음의 시가(時價)를 표시하고 음의 고저(高低) 즉 높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조선 시대에는 율자보, 오음악보, 합자보, 육보 등이 사용되었고 오늘날은 한자로 된 율명이 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단소보의 경우에는 한자 율명 뿐만 아니라 한글 율명, 나, 누, 너 구음법 등이 쓰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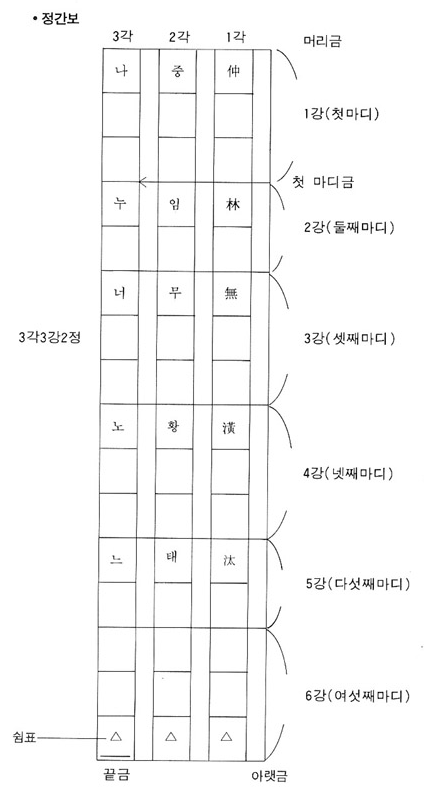
2) 오선 기보법
서양 음악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선보는 17세기 이후 완성된 것으로 비서구음악이나 현대음악을 표기하는 데에는 극히 불완전하고 불충분하며, 유럽음악을 표기하는데 알맞은 기보법이다. 우리의 전통 음악을 기보하는데는 정간보가 가장 이상적임을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교육에서 오선보만을 써 왔기 때문에 본 단소 지도서에는 교사들로 하여금 우리에게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자랑스런 악보가 있다는 긍지를 어린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도상의 편의를 위하여 정간보와 오선보를 함께 싣는다. 그러나 오선보로 표기된 음높이는 상대적이지 절대적 음고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은 서양 음악은 평균율(平均率)이고 국악은 평균율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간보로 된 단소보를 오선보에 옮길 때는 기본음인 黃을 피아노의 Eb으로 삼아 옮기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黃을 D음으로 삼아 역보한다. 이렇게하면 임시표가 붙지 않아 읽기가 쉽기 때문이다. 또한 단소는 다른 악기에 비해 음고가 높기 때문에 오선보로 옮길 경우 덧줄이 많이 붙이 읽기에 불편하므로 악보 ⓒ와 같이 한 옥타브 밑으로 내려 기보하기로 한다.